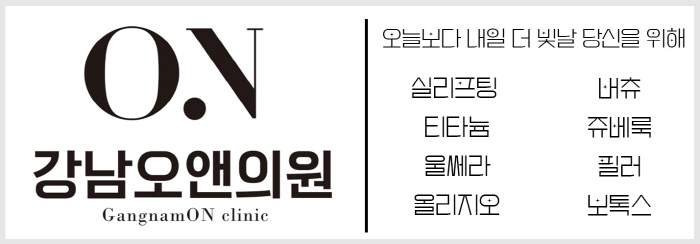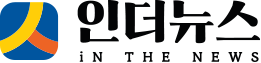언론계 입문을 위한 지상 특강. 국내 유일, 국내 최다 12만명의 회원수를 자랑하는 <언론고시카페-아랑>의 운영진의 협조를 받아 <인더뉴스>의 청춘 독자들께 촌철살인 언론사 취업팁을 전합니다. [편집자주]
[아랑카페 운영자] “저널리스트가 뭐라고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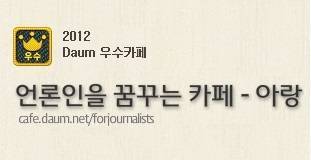 입사 직후 필자에게 어떤 선배가 건넸던 말이다. 사실 지금도 저널리스트를 규정하기는 어려움을 느낀다. ‘저널리스트는 알 권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알 권리와 인권이 상충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저널리스트인가?’ 언론사 입사 때 매년 나오는 면접 주제지만, 수험생들은 저마다의 정의를 떠올린다.
입사 직후 필자에게 어떤 선배가 건넸던 말이다. 사실 지금도 저널리스트를 규정하기는 어려움을 느낀다. ‘저널리스트는 알 권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알 권리와 인권이 상충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저널리스트인가?’ 언론사 입사 때 매년 나오는 면접 주제지만, 수험생들은 저마다의 정의를 떠올린다.
문제는 저널리스트에 대한 사고방식이 올바르지 않을 때 생긴다. 저널리스트는 사실 별 것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 실력은 별로 없는데 특권의식이나 ‘어깨 힘’ 같은 것들만 잔뜩 들어가 있는 기자들도 없지 않다. 하물며 저널리스트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자신만의 자의식이 너무 강하다면 어떨까.
현직 기자로 일할 때는 약간은 ‘으쌰으쌰’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꽤 힘든 취재 현장을 이겨내려면 정신력이 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합격한 다음이라 할 수 있다. 인턴을 했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마치 자신이 기성 기자가 된 듯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하는데, 현직 언론인이 되는 데는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다.
언론사 지망생들을 합격의 문턱에서 좌절시키는 대표적인 주적은 ‘착각’이다. 자신이 많이 안다는 착각, 자신이 언론사를 경험해 봤으니 ‘준 언론인’이라는 착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장수생들은 처음 언론사 입사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
수험생인 나 자신을 장수생으로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 유형별로 정리해 봤다.
#유형1: 마음만은 언론학 박사
가장 가슴 아픈 스타일이다. 아는 것은 별로 없는데 입만 살아 있는 경우다. 면접장에 가서 지원 회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신방과 교수 또는 언론기관 연구원 쯤 되는양 설교를 하는 경우다. “귀사의 기획기사는 너무 어려운 이웃을 조명하면서 눈물을 짜내는 느낌이 든다” “귀사의 다큐는 타사에 비해 단조롭다” 등의 말을 내뱉는 경우다.
또 다른 경우는 외국 신문을 찬양하면서 면접장에서 국내 언론에 대해 노골적인 비하를 하는 경우다.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게 외국 매체가 좋으면 그곳에 취업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유형2: 어설프게 경험한 인턴십
앞서 제시한 유형1과 비슷하다. 실기시험 격인 실무평가에서 대충 취재를 한다던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현직 기자처럼 폼을 잡는 경우다. 아니면 문체에 너무 현학적이라던가, 남을 훈계하는 듯이 글이 들어있는 경우다. 물론 이런 지원자들은 자신이 기사를 잘 쓴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보사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우리는 학보 출신’이라면서 ‘기자님’ 의식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 역시도 면접장에서 결코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 없다. 면접관이 원하는 것은 패기 있는 젊은 신입기자이기 때문이다.
#유형3: 열정만 있는 ‘뇌 청순’
필자의 친한 기자 지망생 동생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다. “기자로서 열정은 좋다. 하지만 신문을 읽어 본 것도, 방송뉴스를 시청한 것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이다. 기자로서 꿈을 물어보면 특파원을 하고 싶다면서 요즘 베이징 특파원들이 무슨 기사를 쓰는지 읽어보지도 않았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시사 이슈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다. 언론사에 가겠다는 사람이 오늘 신문 1면을 모르고 있거나, 요즘 이슈인 안철수 의원 신당 문제에 대해서 전혀 뉴스를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입으로는 치열한 기자정신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유형4: 나만 옳다 생각하는 ‘불통’
최종면접에 한두 번 올라가 봤지만, 합격은 결코 하지 못하는 장수생들에게서 은근히 자주 보이는 유형이다. 논술을 써도 자신의 답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기사를 습작하더라도 기성 기자들을 무시만 할 뿐 자신의 단점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면접장에서도 너무 외골수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입사준비생, 면접관, 더 나아가 언론계 선배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다.
스터디 그룹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사람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논작 스타일이 옳다고 훈계를 하거나, 자신이 늘 하던 방향으로 상식 취합이나 스터디 운영을 하려고 한다. 떨어진 사람의 일상화된 방식이니, 합격은 멀어지는 셈이다.
독자 중 몇몇은 이번 글을 읽으면서 뜨끔했을지도 모른다. 이번 칼럼은 후배 지망생들에게 반드시 해 주고 싶은 말이기도 했다. 하지만 글을 쓰기가 힘들어 2주나 걸렸다. 쓴 소리는 쓰는 사람에게도 고역인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