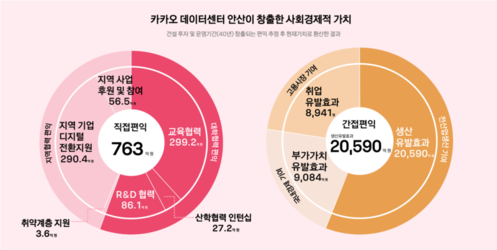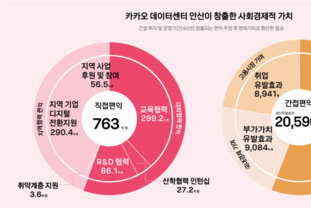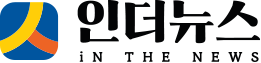[아랑카페 운영자] “자기소개서는 자필로 작성하여 스캐닝한 뒤 입사지원서와 같이 이메일로 제출. 자필 자기소개서가 아닌 경우 서류전형 심사 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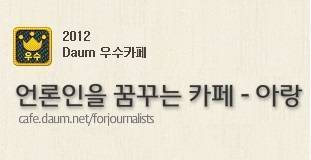 디지털 시대에 자필로 자기소개서를 쓰다니! 경악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현실이 돼버렸으니깐 . 언론고시생 유슬기(24)씨는 “요즘 언론고시생들 사이에서는 필기감이 좋은 펜을 공동구매하기도 한다”면서 “글씨체는 자신을 표현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늘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에 자필로 자기소개서를 쓰다니! 경악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현실이 돼버렸으니깐 . 언론고시생 유슬기(24)씨는 “요즘 언론고시생들 사이에서는 필기감이 좋은 펜을 공동구매하기도 한다”면서 “글씨체는 자신을 표현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늘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제 글씨도 연습해야 하는 시대냐”면서 쓴 입맛만 다시고 있으면 탈락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글씨체는 논술 및 작문, 실무평가에서의 기사작성 등에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후배들에게 논작문 답안지에는 반드시 글씨를 예쁘게 써야 한다고 말한다. 신언서판(身言書判ㆍ인물 평가의 기준인 몸, 말씨, 글씨, 판단 등의 4가지) 같은 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당장 판독의 문제가 있다. 글씨 때문에 중요한 논술문의 단어를 오독(誤讀)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고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 빼어난(?) 악필로 인해 이름이 잘못 판단되거나 논술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고교 논술 사설업체에서 채점을 해봤지만, 정말 알아볼 수 없는 글씨인 경우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했다. 수험생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힘든 마당에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건 당연지사였다.
다른 이유는 채점관들의 상황을 들 수 있다. 언론사 입사 전형의 논작문 채점관들은 2~3일 동안 수백장에서 많게는 1000장까지 채점을 해야 한다. 3명의 심사위원이 있으면 각자 모든 답안을 읽어보고 점수를 매겨 평균을 하거나 아니면 합의제로 점수를 확정하기도 한다. 악필이 한 10장만 연달아 나오더라도 짜증이 난다. 이럴 때 깨끗한 글씨로 타당한 주장을 펼치는 수험생이 있다면 제대로 어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씨를 잘 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연습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고교 시절 풋풋한 연애를 벗삼아 교환일기 같은 것을 써보는 방법이다. 필자의 경험상 교환일기 한 2~3권만 쓰면 한 평생 쓸 수 있는 예쁜 글씨가 확립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논작문 연습을 할 때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한다는 기분으로 글씨를 예쁘게 써 버릇해야 한다. 또한 친구들 중 좋은 글씨가 있다면 이를 따라해 보는 것도 좋다.
대학 수업 중 글쓰기 시간에 꾸준히 과제를 하면서 글씨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학생 중 일부는 이런 교양 수업을 ‘의무’ 정도로 치부하고 대충 임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 활용하면 글 솜씨도 늘고, 글씨체도 확립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현직 언론인이 된 뒤에는 악필이 은근한 재미가 되기도 한다. 재난 현장에서 급박하게 취재팀을 꾸려 일을 할 경우가 그렇다. 취재 수첩에 잔뜩 뭔가를 기재했는데, 선배가 급하다면서 “적은 것 가져와봐”라고 했는데, 수첩 속 글씨를 못 알아볼 경우가 있다. 자신이 급히 적은 것을 알아보지 못해 전화로 선배에게 보고하다가 버벅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에는 온갖 동물의 아기 시절을 뜻하는 단어를 ‘양껏’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