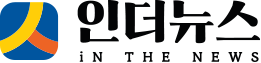[아랑카페 운영자] 언론계 입문을 위한 지상 특강. 국내 유일, 국내 최다 12만명의 회원수를 자랑하는 <언론고시카페-아랑>의 운영진의 협조를 받아 <인더뉴스>의 청춘 독자들께 촌철살인 언론사 취업팁을 전합니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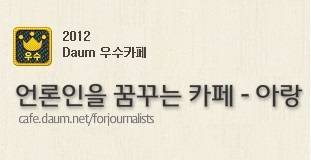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개념이다. 신문기자가 방송기사를 쓰고, 방송기자가 긴 호흡의 글을 쓰는 일이 말이다. 종합편성채널을 갖고 있는 신문사들은 자사 기자들을 대거 계열 종편에 출연시키고 있다. 일부 기자들은 방송 보도국에 파견돼 뉴스를 전달하기도 한다.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SBS 기자들이 긴 호흡의 취재일기를 써서 포털사이트에 출고하는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이들의 취재일기는 심도 있는 분석과 폭 넓은 취재가 눈에 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개념이다. 신문기자가 방송기사를 쓰고, 방송기자가 긴 호흡의 글을 쓰는 일이 말이다. 종합편성채널을 갖고 있는 신문사들은 자사 기자들을 대거 계열 종편에 출연시키고 있다. 일부 기자들은 방송 보도국에 파견돼 뉴스를 전달하기도 한다.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SBS 기자들이 긴 호흡의 취재일기를 써서 포털사이트에 출고하는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이들의 취재일기는 심도 있는 분석과 폭 넓은 취재가 눈에 띈다.
신문과 방송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인터넷이라는 무한 경쟁 플랫폼에서 미디어 빅뱅이 일어나고 있다. 신입 기자의 경우 신문과 방송, 인터넷의 장벽이 가장 많이 허물어 졌다. 채용에서도 일정부분 공유하는 경우도 많다. 중앙일보와 JTBC의 통합 공채가 그렇다. 지금까지 두 차례 치러진 통합공채에서는 신문에서의 기사 작성, 취재 능력 평가는 물론, 방송에서의 리포팅, 취재능력, 영상 취재 등도 함께 평가한다. 신문과 방송의 베테랑들이 심사위원으로 투입된다. 채용은 따로 하지만 동아일보 역시 젊은 기자들을 대거 채널A에 순환 배치한다.
이러한 시험 경향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취재현장에서 방송 리포트를 만들라는 시험 과제가 SBS(기자채용 중 가장 최근인 2012년에는 스마트폰에서 유심 칩을 빼고 인터뷰를 해 제출하라는 문제가 출제됐다)에서도, 중앙일보에서도 출제되는 셈이다.
기자와 아나운서의 장벽, PD와 기자의 장벽, PD와 아나운서의 장벽도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기자보다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해 화제가 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떠올려 보면 되겠다. CBS에서는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PD가 직접 진행자로 나서 어느 아나운서보다도 깊이 있는 시사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사실 신문과 방송의 장벽이 무너진 것은 지역 주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 이전에도 신문 출신으로 방송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언론인들이나, PD를 하다가 기자가 된 사례, 아나운서를 하다가 기자로 전업한 사례 등 전례를 찾자면 꽤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입사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포인트다. 멀티형 저널리스트로서의 역량이 더 절실하게 됐다. 무작정 글만 잘 쓴다고 해서 언론인이 되기가 힘든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