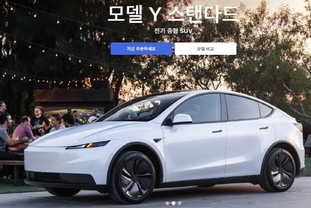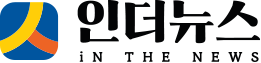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초 광주 화정동에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붕괴사고는 무단 설계 변경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옥상층인 39층 바닥 시공방법을 현장에서 무단으로 변경하고 고층건물일 시 최소 3개 층에 설치해야 하는 가설지지대(이하 동바리) 조기 철거로 인해 하중 부담 가중을 부르며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4일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조위가 밝힌 사고 원인은 크게 ▲옥상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에 대한 무단 설계변경 ▲동바리 조기 철거로 인한 하중 부담 가중 ▲건축물 콘크리트 강도 미달이었습니다.
우선, 기존 설계도서에는 옥상층 바닥시공의 경우 일반 슬래브를 시공하고 지지하는 방식은 동바리를 설치토록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일반 슬래브를 데크슬래브로, 동바리를 콘크리트 가벽으로 무단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PIT층의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조건보다 증가하고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PIT층 하부 동바리 조기 철거로 층내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게 만들어 버린 것 또한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지지로 인해 하중을 지지하는 부담이 가중되며 결국 1차 붕괴와 건물 하부방향까지 연속적인 붕괴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 중인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동바리를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했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나타나며 무단으로 기준을 어긴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 강도보다 미달 수치를 보인 것도 붕괴의 주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사조위에 따르면,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외벽이 붕괴된 17개층 중 15개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에 85% 수준에 미달했습니다. 강도 부족으로 인해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하며 안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조위는 공사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전에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 부족과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을 미준수하며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제도이행 강화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제도이행 강화’는 설계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 시 관련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강화 및 안전과 관련된 건설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감리제도 개선’은 감리자가 발주자와 시공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감리 관리기능의 강화의 필요성으로 제시됐습니다.
‘자재·품질관리 강화’는 레미콘의 생산과정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현장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자의 겸직 금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하도급 제도 개선’은 이면계약과 같이 비합법적 하도급 계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규용 충남대 교수는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 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PIT층(옥상층과 바로 아래층 사이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 바닥이 무너지고 옥상층인 39층 하부로 아파트 건물 지상 23층까지 외벽이 파손·붕괴되며 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