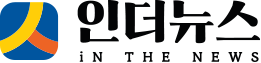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금융당국이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보험사들 스스로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장수리스크 측정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장수리스크 관심 확대와 시사점’에 따르면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장수리스크를 별도로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사망률이 빠르게 낮아지는 동시에 생명보험회사와 연금사업자의 연금부채가 증가하면서 지급 가능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도 생명보험 보험리스크를 담보별로 세분화하면서 장수리스크를 별도로 반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게 연구원은 진단이다. 연금보험의 유지율(7년 유지율 약 30%)과 개인연금 전환율(59.3%)이 높지 않으며, 생명보험회사의 부채가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에 분산돼 있고,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하지만, 연구원은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 ▲핵가족화의 진전 ▲경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종신연금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생보사들의 장수리스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구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부양할 근로인구가 대폭 감소하면서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며 “1955년생부터 시작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가속으로 인한 종신연금 수요 확대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가족을 통한 장수리스크 분담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며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등으로 1∼2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생명보험회사들이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장수리스크 측정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수리스크 관리방법으로 해외에서는 장수 스왑(longevity swap), 장수채권(longevity bond)과 같은 장수 파생상품을 이용해 장수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에서 장수채권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장수채권의 경우 해외에서도 발행 성공사례가 없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수리스크가 자본시장을 통해 거래된 적이 없다”며 “다만, 선제적으로 장수리스크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장수 파생상품이 도입될 경우 사망률 데이터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생존확률 예측 방법, 가격산출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장수지수의 개발,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생명보험사들 또한 장수리스크에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원은 “장수리스크 측정을 위해서는 확률적 사망률 모형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테스트나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해야 한다”며 “장수 파생상품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헤지(natural hedge)를 위한 적정한 상품 포트폴리오 유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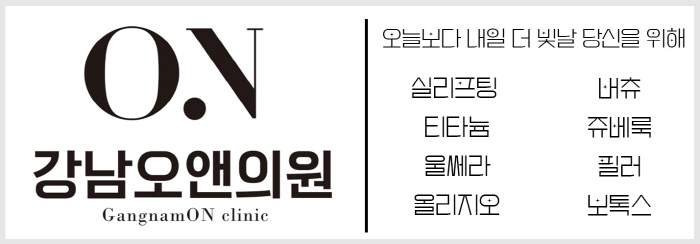


![[실적발표 후 UP & DOWN] “기아, 3분기 이익부진 불구 목표가 상향”…배경은?](https://www.inthe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1543309021_7f8e8b_120x9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