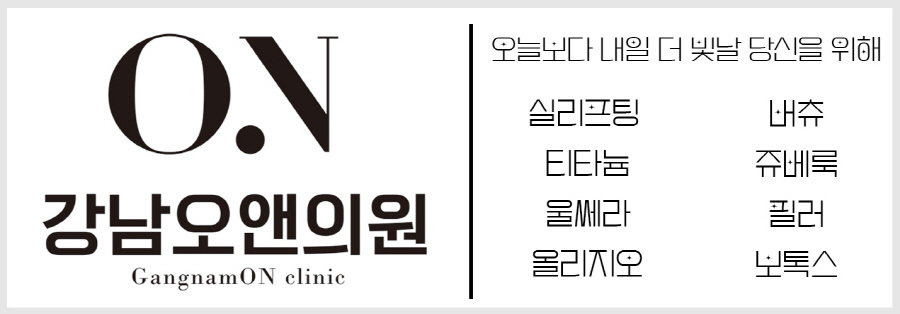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건 혐오감을 뛰어 넘어 성적 수치심까지 느껴지는데요.“ “질병을 경고하기 위해 노골적인 그림과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반인륜적으로 느껴지는 그림도 꼭 넣어야 하나요?” “하다하다 별걸 다 합니다.”
애연가들 사이에서 담뱃갑 경고 그림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전국에 확대 판매한 담뱃갑의 일부 경고 그림에 대해 혐오와 충격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까지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흡연자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예민한(?) 반응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담뱃갑 경고 그림은 10가지로, 지난해 12월 23일 시범 판매를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산됐다. 경고 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과 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경고)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띄고, 메시지 전달효과도 높은 편이다. 특히 유아나, 청소년 등에 담배의 폐해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다. 폐암과 후두암, 심장질환, 뇌졸중의 질병이 일어난 신체부위 또는 임신부 흡연, 성기능 장애, 조기사망 등을 주제로 한 사진을 담고 있다.
시각적 이미지는 (경고)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띄고, 메시지 전달효과도 높은 편이다. 특히 유아나, 청소년 등에 담배의 폐해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다. 폐암과 후두암, 심장질환, 뇌졸중의 질병이 일어난 신체부위 또는 임신부 흡연, 성기능 장애, 조기사망 등을 주제로 한 사진을 담고 있다.
지난 201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01개국에서 담뱃갑 경고 그림을 부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10년 전부터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경고 그림 의무 사용을 권고해지만, 지난 2015년 10월 민관 합동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한 뒤 해외 경고 그림 800여 건을 분석해 최종 후보 10종을 제작했다.
작년 연말부터 시범 판매를 시작으로 지난 1월 확대되면서 SNS상에서 담뱃갑의 경고 그림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경고 그림이 너무 노골적이고, 징그러워 혐오스럽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이런 반응이야 상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흡연자들은 "경고 그림이 불쾌감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남성 성기능 장애에 대한 경고 메시지에 남성의 주요 부위에 이미 태워 고꾸라진 담배재를 표현한 것이 해당된다는 것. 지난 20년간 흡연한 A씨의 경우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고, 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경고를 넘어서 이건 흡연자를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특히 남성 성기능 장애에 대한 경고 메시지에 남성의 주요 부위에 이미 태워 고꾸라진 담배재를 표현한 것이 해당된다는 것. 지난 20년간 흡연한 A씨의 경우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고, 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경고를 넘어서 이건 흡연자를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